
클릭 한 번으로 낙타에 투자하고, 두리안 농장 지분을 산 뒤 언제든 되팔 수 있다.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토큰화’라면 가능한 이야기다. 플룸 네트워크는 커뮤니티 기반 수요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물연계자산(RWA)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전통 금융 기관이 주도하던 자산 토큰화 흐름에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사용자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RWA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는 스테이블코인이 꼽힌다.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초창기 가상자산 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후 사용자 기반이 급격히 늘어나며 가치 저장 수단, 유동성 자산, 기관 투자 수단으로까지 확장됐다. 크리스 인 플룸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장 배경에 대해 “처음부터 크립토 사용자를 위한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RWA 역시 이 같은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파이에서 실물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시장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플룸은 자산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디파이에서 예치, 대출, 재활용까지 가능한 RWAfi 구조를 지향한다. 수익형 부동산, 농업 인프라, 에너지 프로젝트 등 실물 기반 자산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처럼 구성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한다. 예치한 RWA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다시 예치해 운용 규모를 키우는 ‘루프 운용’ 전략도 가능하다. 디파이에서만 구현되던 반복 운용 구조를 실물자산에도 적용한 셈이다.
플룸은 기존 RWA 프로젝트와 지향점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온도 파이낸스 등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기관 대상 구조를 설계한 다른 모델과 달리, 플룸은 다양한 RWA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인 대표는 “미국채는 이미 전통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라며 “크립토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플룸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플룸은 디파이 커뮤니티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자산부터 구축했다. 커스터디 기능과 규제 준수 체계를 지갑 내에 함께 구현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다루듯 손쉽게 실물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 대표는 “온체인에 올라온 자산이 오히려 기존 실물보다 더 유연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며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RWA 토큰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질수록 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이후 전통 자금 유입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설명이다.
플룸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가상머신(EVM)과 호환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라틴아메리카, 동남아, 중동 등 사용자 기반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 중이다. 테스트넷 기간 중 375만 명의 고유 사용자가 참여했고, 2억 6500만 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국내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플룸 네트워크의 유틸리티 토큰인 플룸(PLUME)은 올해 코인원(2월), 빗썸(3월)에 연이어 상장했다. 오는 9월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K-콘텐츠, 음악, 캐릭터 등 문화 기반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 글로벌 사용자와 연결하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RWA로 발행하는 실험은 한국이 가장 유리한 시장이라는 판단이다.
이달 세계 4대 사모펀드 운용사 아폴로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며, 플룸은 제도권 자금과 디파이 사용자 간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아폴로는 플룸을 “온체인 사모 자본 시장과 펀드 금융의 차세대 인프라”로 평가하며, 디지털 활용성과 투자자 경험을 동시에 강화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디파이 생태계가 주도하는 RWA 프로젝트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 도예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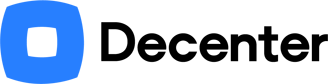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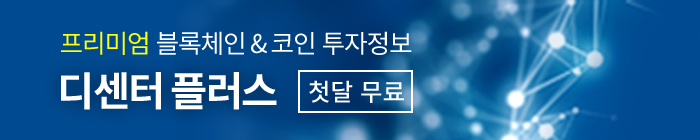

![[단독]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테크 연합군' 먼저 허용](https://newsimg.sedaily.com/2026/01/05/2K76OYC7PZ_6_s.png)
![비트코인 아냐…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이 코인'은 [코주부]](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A56SQI_3_s.jpg)

![테더의 폭풍 매수…비트코인, 새해 들어 소폭 반등 [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9V8YC5_3_s.jpg)


![비트코인 8만8천달러 박스권…"연말 반등" vs "추가 조정" [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5/12/22/2H1TU3YMBP_1_s.png)
![비트코인 8만 7000달러대 강세…리밸런싱 수요 주목[디센터 시황]](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JLO6GV_1_s.png)








